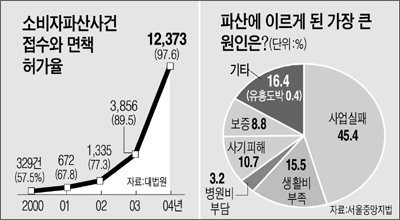|
|
|||||||||||||||||||
|
|
서민을 위한 대안은행, 새로운 상상력의 시작
‘사회연대은행’과 ‘신나는 조합’으로 명명한 대안은행이 주목받고 있다. 이들 ‘대안은행’은 비록 수신기능(예금유치기능)은 갖고 있지 않지만 은행권이 담당하던 일부 영역, 곧 빈곤층의 창업자금 대출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이들은 담보가 없다는 이유로 은행으로부터 배제된 사람이더라도 굳건한 자활의지만 확인되면 창업에 필요한 최소한의 자금을 제공한다. 그런데 이들 은행은 90%를 훌쩍 뛰어넘는 대출상환실적을 거두고 있다. 그 이면에는 ‘두레일꾼’ 또는 ‘RM’이라고 불리는 전문 후견인 제도를 활용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대안은행이 주목받고 있는 것은 수익성, 효율성이 모든 것에 우선하는 소위 신자유주의 시대의 시대정신을 거스르면서 성공을 거두고 있기 때문일 것이다. 아마 더욱 사람들을 감동시키는 것은 선의를 가지고 누군가를 도와주었을 때 선의로 돌아온다는 자명한 사실이 확인되기 때문일 것이다. 그리고 은행권이 툭하면 요구하는 담보니, 보증인이니 하는 ‘못 믿겠다’식의 불신의 벽을 넘어서는 인간믿음의 실천에 우리가 굶주려 있기 때문이다. 물론 이러한 대안은행은 주체들도 인정하듯이 경제양극화, 빈곤의 구조화 문제를 해결하는 근본적인 처방이 될 수 없다. 혜택을 입는 사람들도 극히 제한적일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이러한 대안은행 실험은 전 세계적으로 실천되고 있고, 그 한계에도 불구하고 나름의 성과를 거두고 있다. 방글라데시의 그라민 은행은 '신용은 모든 인간의 기본권'이라는 신념으로 제도 금융에서 소외된 극빈자들에게 무담보, 무보증 소액 융자를 단행, 지난 26년간 방글라데시 인구의 10%를 넘는 240만 가구에게 자력갱생의 희망을 안겨주었다. 그런가하면 뉴질랜드에서는 모든 금융기관이 모두 외국에 넘어가자 노동당, 동맹당 연립정부 주도로 국민은행(민중은행)이 설립되었다. 이 은행은 낮은 대출금리와 낮은 수수료를 내세워 서민들에 대한 대출문턱을 대폭 낮추어 상당한 성과를 내고 있다. 맑스의 표현을 빌자면 신용은 가공자본을 만들어내는 요술방망이다. 흔히 여신, 혹은 은행차입으로 표현되는 가공자본은 자본주의 내에서 자본순환의 윤활유이자 주기적인 공황을 만들어내는 주범이 되기도 한다. 특히 우리처럼 개인부채가 기업부채를 넘어서고, 개인이 창출한 신용으로 만들어진 유휴자본이 투기자본으로 떠도는 상황에서 개인 신용을 무조건 확대하자는 것도 한계가 있다. 그런데 서민들이 필요한 은행대출은 대개가 질병에 의한 가계파산을 막기 위한 수단이거나 직업을 잃고 자영업을 하기위해 이용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소위 사회안전망이 확립되거나, 노동권이 보장되어 제대로 된 일자리가 보장된다면 사실, 서민들의 은행대출은 거의 필요가 없어지게 된다. 물론 농민은행과 같이 종자, 비료 등을 구매하고, 이후 물건을 팔아서 빚을 청산하는 등의 특수한 역할을 하는 은행도 있을 수 있다. 하지만 궁극적으로 신용이 천부의 권리라 하는 것은 자본주의하에서 자본가들이 독점하고 있는 신용대부를 개인들도 좀 이용하자는 식의 소극적인 평등주의일 따름이다. 다시 말해 신자유주의 흐름에 저항하는 보다 인간적인 자본주의를 지향하는 개량의 흐름이라는 것은 부정할 수 없다. 그러나 이러한 실험은 인간에 대한 신뢰를 그가 가지고 있는 자산과 은행거래 실적으로 바꾸어 버리는 소위 물신숭배-인간과의 관계를 자본, 상품관계로 대체하는-에 대한 문제의식과 저항을 표현한다는 의미에서 주목할 만하다. 대중들이 갖고 있는 상식, 즉 사람 됨됨이가 그 사람을 평가하는 잣대이고, 그의 약속은 그가 처한 절박함에서 나오는 것이고 그런 약속은 지켜질 수 있다는 생각이 자본의 논리나 은행들의 얄팍한 안전장치보다 훨씬 합리적이라는 사실이 현실을 통해 확인되어야 한다. 사람은 존중되어야 하고, 돈과 이윤보다 인간이 우선되어야 한다는 생각은 야만적인 자본주의를 부정하고 새로운 사회를 향한 열망의 기초가 될 것이다. 이러한 기초가 자본주의내에서 비자본주의적 운영원리, 연대의 운영원리를 실험하는 속에서 갖추어 질 수 있다면 얼마든지 환영할 만한 일인 것이다. |